
-
불발된 고준위특별법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며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심의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은 모두 3개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 작업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류해왔다. 주요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규모 등이다. 정부·여당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 처분시설의 확보 시점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관련해서는 원자로 운영허가가 향후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기존 원자로가 설계될 때 명시된 수명 기간까지만 고려해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됐던 법안을 당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중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20일 경주시 등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21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고, 지자체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원전 내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포화시점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아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연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정부도 해오름동맹 성공 위해 관심 기울이길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가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를 열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적인 모임이지만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3개 도시 실·국장 등 42명이 참석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와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그동안 모색해온 협력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간 상생협력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 사항은 기존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공간거점 위주의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속 연계협력을 통한 도시권 경쟁력 강화, 해오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협력해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협력 분야는 경제산업, 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해양물류, 삶의 질 등을 꼽았다. 또 핵심 선도 사업(안)은 해오름 친환경 첨단산업지대 구축, 세계적인 강·산·바다 정원도시 조성 등 해오름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공간 거점 육성 계획을 담았다. 무엇보다 해오름동맹은 시·도와 광역·기초단체를 넘어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로서 주목받을만하다. 3개 도시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재편과 메가시티 추진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오랜 세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해온 해오름동맹은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 보인다.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오름동맹과 같은 자발적인 상생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일 경제권 성장, 초광역 교통망 형성, 광역문화 관광권 조성, 도시 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나아가는 해오름동맹을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로의 전환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로의 전환경주에서는 국제행사, 전시,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하고 많은 행사가 개최된다. 이를 위한 인프라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KTX 신경주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시간 연결도로망도 잘 구축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확충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어 경주로 오고갈 때 항공편 이용에 대한 홍보도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주시는 2025년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사 개최지인 보문관광단지에는 대규모 컨벤션 시설인 화백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있고, 타 도시에는 흔치 않은 특급호텔을 비롯한 양질의 숙박시설이 충분하다. 단순 행사개최를 위한 인프라만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 집적된 도시로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려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 또한 크게 상승할 것이다.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고민했던 것은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파급효과를 도심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해 볼 수 있는가였다. 개최 장소인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집중과 이목을 도심으로까지 넓혀 도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면 행사 개최로 인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일명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불리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은 도시의 중심지역을 핵심 대중교통시설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복합용도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되, 외곽은 저밀도의 자연생태지역으로 보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다. 도시의 외연적 확장보다는 압축적 도시개발을 통해 이동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도입하기에 친환경적인 탄소중립도시의 계획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 폐경주역 부지를 복합용도의 중심지구로 개발한다고 하니, 이를 행정·문화·복지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용도로 조성하고 여기에 대중교통 중심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의 핵심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아니면 현 터미널 부지를 기존의 도시간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기능과 함께 보문단지와 신경주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중간지점 성격을 가지는 복합중심지로 조성할 수도 있다. 전자는 과거 경주역이 담당했던 도심지역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역사성을 되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주 도착은 옛 경주역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많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단순히 도착지점으로서의 경주역이 아닌 이제 막 경주관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갈 곳을 안내하고,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 역할도 했다. 경주역 동측으로는 경주읍성이 일부 복원되었고,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터미널 부지 또한 봉황대 지구와 황리단길 등 도심으로의 보행 접근성이 훌륭하다. 기존의 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주에 필요한 용도와 시설을 복합화하여 중심 지역으로 조성할 경우 또하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시설은 대규모의 정차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지방 도시가 그렇겠지만, 경주도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동차 중심 도시다. 도처의 관광지들을 렌트카나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여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일부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코스별 관광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같은 대중교통지형형 도시개발의 장점은 무엇보다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걸어서 도심을 둘러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경주역과 터미널을 핵심 지점으로 그사이를 사람들이 보행을 통해 오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중심상가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2024년 선거! 당선의 적임자는?
2024년 선거! 당선의 적임자는?내년에 경주는 어느 분이 당선이 될까? 그림이 그려지고 예측도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이 쏠리는 이곳에서 말하기는 왠지 꺼려진다. 비겁하다 할 수도 있고 괜히 척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인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생각을 적극 말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출마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적극 의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들을 경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거의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경주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각 정당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고 있어 경선을 거쳐야 하기에 더욱 이러한 소수의 적극층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공천이나 당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아니오!’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에도 ‘아니오!’라고 판단하고 싶다.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답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적극층이 나타내는 표현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다가올 것이고, 이들을 배제하고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현 등이 소극적이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필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괜히 척이라도 질까봐 표현에 소극적인 비겁함을 내포하고 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에 직접선거가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이뤄진 선거운동의 형태를 보면 큰 틀에서 별반 달라진게 없다. 합동연설회에서 TV토론으로 바뀌었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이 주요 변동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을 가지고 다단계 형식의 선거운동, 주요 행사 등에 가서 얼굴을 내비치고 주요 길목에서 인사와 명함 배포 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에 전적 의존해야 하는 선거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는 적극 표현층의 소수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태로 선거가 계속 치러지고 행해진다면 능력은 있는데 대중 앞에 민낯을 보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역으로 표현하면 능력 있는 선출직 지도자 탄생도 더욱 요원해지면서 국가·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선거는 이렇게 전개돼왔다.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 선거에 여태 없었던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돼 부패한 국민의힘 세력 등을 척결해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던 검찰총장이 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직무를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무한 신뢰를 보냈고 권력 핵심을 건드린 대가로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 결과, 검사만 했고 정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시대에서 다수의 평가를 받아 결정되는 시대가 되는 큰 변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현상이 한순간의 신기루가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흡사한 과정을 밟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와 지지가 결코 가볍게는 보이지 않는다.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많은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진행형인 민주당, 큰 악재없이 가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거의 없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내년 선거는 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공격은 하되 결과물이 없다 보니 상대편의 계속된 악재에도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젠 지역 선거도 이럴 것이다. 비방이나 과대포장, 조직의 움직임보다는 현직에게서는 임기 중 어떤 정책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뤘고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는가를 볼 것이다. 신인에게는 공약, 정책의 방향성 등에서 어떤 비전을 볼 수 있는냐가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최근 경주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황리단길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을 누가 조성했는가? 누구도 아니며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진 것이다. 시민들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지도자! 황리단길처럼 많은 국민들이 찾는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 낼 줄 아는 창의력 있는 지도자!를 바란다. ‘자고 나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하듯이 지금은 엄청난 속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다. 이제는 선거도 여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돼야만 더욱 밝은 사회가 된다. 표현에 주저하는 비겁함을 던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풍토도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첫걸음이다. 2024년 선거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혁명이라 불릴 만큼 변화를 기대하며, 선출직 탄생의 방식에 큰 변곡점이 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가난을 벗삼은 화계 류의건 (3)
가난을 벗삼은 화계 류의건 (3)화계(花溪) 류의건(柳宜健,1687~1760)은 경주 내남 화곡의 아름다운 산수를 벗 삼아 유유자적 글을 읽고 참된 선비의 길을 걸으신 산림처사(山林處士)였다. 그는 자연에 묻혀 지내며 가난과 부유함은 하늘의 명에 달렸고, 구복(口腹)을 채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하지 않았다. 또한 『맹자』 「진심(盡心)상」의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 그리고 평소 거문고를 통해 영욕(榮辱)과 시름을 멀리하였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의 바름을 얻고자 하였다. 가난은 간난(艱難: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닥친 상황 즉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를 말한다. 선비로서 시와 음악을 가까이하면서 자신을 수양하지만, 그의 삶은 늘 넉넉지 못하고 곤궁한 생활에 아내와 자식들이 고달파하기 일쑤였다. 그가 남긴 시작품 가운데 ‘가난’에 관한 자신의 소회를 읊조린 부분이 종종 나타난다. 경주부윤 조명정(趙明鼎)에게 보낸 시에 “집이 가난해 손님은 적어 문은 늘 닫혀있고, 몸은 병들어 즐겁지 않아 독서도 손을 놓았네(家貧少客常關戶 身病無悰亦廢書)”라며 가난해서 찾아오는 이 적은 벽촌에 몸은 병들고 좋아하는 독서마저 내려놓았다. 손님이 찾아오면 주안상과 식사조차 어려운 궁핍한 처지가 눈에 선하다. 포도나무를 보며 지은 시에 “큼직한 꽃 무더기를 마음껏 차지하니, 선비의 생활 온전히 가난하지는 않다네(大宛芳叢能擅有 書生活計未全貧)”라며 비록 가난하지만 자연이 주는 꽃의 아름다움에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다는 지조의 마음이 느껴진다. 조상의 무덤을 옮기려는데 사정이 어려워 친구의 도움을 받은 시에 “가난한 몇 해 혀로 밭을 가는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촌 늙은이 지금까지 되레 부러웠다네(螢雪幾年費舌耕,到今還羡老田更)”라며 생활을 영위하고자 학문을 가르쳐 주고 곡식 등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설경(舌耕)의 표현을 하였다. 그는 후학양성을 위해 화계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평소 그는 가난에 대해 자득(自得)하였는데 “졸렬함이 처세임을 진작에 알았지만, 가난을 따지지 않는 가업을 전하고 싶다(已知處世爲謀拙 更欲傳家不計貧)”라며 세상을 향한 소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가난 때문에 도를 벗어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다짐한다. 그리고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만 가난해 취하기 어렵고, 늙어도 독서하는 삼여(三餘) 아깝지 않네(愛酒貧難謀一醉 看書老不惜三餘)”라며 독서의 즐거움과 가난으로 좋아하는 술을 즐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독한 굶주림에 대해서 “부엌에서 솥을 씻는 야윈 아내와 앉았는데, 동문 열리니 아이가 밥 달라고 울어댄다(洗鐺厨下坐羸婦 索飯門東啼小兒)”라며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데도 공연히 솥을 씻어대는 아내와 아침이 되자 밥 달라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에서 곤궁한 삶이 절실하다. 이 외에도 화계는 가난과 질병으로 더욱 힘든 노년을 맞이하였다. 늘 거친 밥과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대장부로서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였다. 『장자(莊子)』 「도척(盜跖)」에 “요임금과 순임금은 천하를 소유하였지만, 자손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었다(堯舜有天下 子孫無置錐之地)”라 하였는데 화계는 송곳조차 없으니 송곳 꽂을 땅을 묻지 말고, 칼이 있어도 탄협가(彈鋏歌:더 나은 대우를 원하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는 노래) 부르기조차 부끄럽다며 참으로 어려운 처지를 문학적으로 표출해 내었다. 화계는 가난하였지만, 학문과 수양의 끈을 놓지 않았고, 평생을 학문하는 선비로 일생을 마쳤다. 공부하는 필자 역시 가정유지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부유하면 공부가 게으르고, 가난하면 독서조차 힘이 드니 적당한 중도(中道)의 경제사정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화계 선생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적당한 경제사정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말하는지?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소통은 없고 쇼맨십만 있는 세상(2)
소통은 없고 쇼맨십만 있는 세상(2)스마트 세상은 세계를 가깝게 했지만, 개인은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톡을 하고, 목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보다 문자가 편하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모두가 적절한 핑계로 스마트폰을 택한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할까 말까 난감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을 보며 무시한다. 어색한 소통의 시작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소통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보다 십 년 후, 이십 년 후가 더 걱정된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의견이 나뉘고 불화가 생기고 그걸 조정하고 화해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들끼리 금방 풀릴 문제도 어른들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도, 없지 않아 보인다. “낄끼빠빠 - 낄 데 끼고, 빠질 데 빠져야 한다” 아줌마는 이 말이, 요즘 부모들이 잘 알고 실천해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줌마들 모임에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노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있으니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아이들끼리 서로 조정하도록,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관여하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서로 다투며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님이 개입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한 시간쯤 흘렀을까, 이상한 광경이 아줌마 눈에 들어왔다. 부모가 폭력 사태로 끼어들어야 할 정도로 투닥거리던 두 남자아이는 아무 일 아니었다는 듯이 친하게 놀고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편치 않은 안색이었다. 나중에 아이들 무리에서 가장 큰 중학생 형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리하자면, 두 아이의 입장은 각자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이었고 상대방을 각각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이 상했고 때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 정도 일은 우리가 지낸 시간이 있고, 앞으로 지낼 시간이 더 있으니 아이들 자신도 정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끼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뼘 더 자라있다는 말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 날이다. 이런 이해와 공감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하기보다 몇 개의 문자에 의존한다. 소통의 기본 능력은 상호작용을 통해 익혀 나간다. 내가 말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소통을 통해 익힌다. 누가 말을 못 한다고 따지는가? 아줌마는 자신 있게 답한다. 말 못 하는 사람이 많다. 말만 할 뿐이지 내용이 없거나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는 엇나가고 감정만 상한다. MBTI의 문제도 아니다.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것과 별개다. 각종 인터넷방송에 익숙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에 따라, 관계에 따라 말은 달라져야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을 보면 어디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배울까 심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고 얼굴을 마주하자. 상대의,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 공감과 배려가 가득한 세상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자. 우리 가족부터.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1853년 브람스는 요아힘의 추천장을 들고 슈만을 찾아간다. 그때 슈만은 정신착란증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맡고 있던 뒤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자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슈만은 듬직한 이 독일 청년의 작품을 보고는 자신이 창간한 음악신보(Die Neue Zeitschrift für Musik)에 극찬을 아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브람스는 슈만이 보증하는 일류 음악가의 대열에 서게 된다. 슈만은 그 후 몇 달 지나 지휘자 직에서 물러난다. 정신병이 도진 것이다. 이듬해에는 라인강에 뛰어든다. 마침 강을 지나가던 어부 덕분에 구사일생했지만 온전한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슈만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는 2년 후 생을 마감한다. 이렇듯 브람스와 슈만의 인연은 오래 이어질 수 없었다. 불과 3년을 함께 했을 뿐이다. 이 3년 동안 브람스는 정신병자 슈만과 그만을 사랑했던 클라라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날 ‘슈만과 클라라’는 마치 고유명사 같다. 그만큼 그들의 사랑은 드라마틱했다. 슈만은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피아노 교육자 비크(Johann Gottlob Friedrich Wieck/1785-1873)의 문하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클라라(Clara Josephine Wieck/1819-1896)를 만나게 된다. 당시 비크의 딸 클라라는 눈부신 외모를 가진 10대 소녀였다. 슈만은 특유의 언변으로 클라라를 공략하기 시작한다. 피아노밖에 몰랐던 클라라는 9살 연상의 슈만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비크 교수는 슈만과 클라라의 교제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슈만이 애제자임에는 분명했지만, 금지옥엽 기른 외동딸을 주기에는 미덥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특히 손가락 부상으로 더 이상 피아노연주를 하지 못하고, 대신 작곡과 평론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슈만의 경제적 능력이 문제였다. 하지만 비크의 반대에도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슈만이 클라라와의 결혼을 요구하자 비크는 소송으로 딸을 지키려 했다. 법원은 슈만의 손을 들어 주었다. 1840년 슈만과 클라라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다. 슈만이 서른 살, 클라라가 스물한 살 때다. 슈만과 비크는 소송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화해를 한다. 이렇듯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한 슈만과 클라라 사이를 브람스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브람스와 클라라가 처음 조우했을 때, 브람스는 스무 살, 클라라는 서른네 살이었다. 열네 살 연상의 클라라에게 반한 브람스는 수줍은 사랑고백을 하지만, 클라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람스는 평생 해바라기같이 한 여인을 바라보며 독신으로 지낸다. 클라라는 슈만이 정신병원에서 죽은 1856년부터 40년 동안 슈만 부인으로 남아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여생을 보낸다. 1896년 클라라가 죽자 이듬해 브람스도 그녀를 따라간다. 이 정도면 ‘클라라와 브람스’를 또 다른 고유명사로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젊은이와 과연 다를까?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젊은이와 과연 다를까?어느 사이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노년인구는 다수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의료시설과 의학의 발달, 적절한 영양공급, 노인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시설들의 증가가 노년 인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데 정작 법과 제도는 노년을 외면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노인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을 줄이려 든다. 법과 제도를 다루고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노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고 노인을 쓸모없이 예산만 축내는 부류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인복지와 노인예산을 쉽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자신은 노인이 안 될 것 같은 착각이 동반된다. 언제나 청춘일 줄 아는 젊은이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지만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 역시 노인이 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짐으로 여겨지고 걸림돌로 치부되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반복적 진리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음을 누리는 동안의 달콤함에 탐닉한 나머지 자신은 영원히 젊을 것처럼 착각하기에 노인에 관한 일은 멀고 먼 남의 일로 여기기 쉬운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노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둔하고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거나 달관하지 않는데도 젊은이들은 으레 노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많은 원칙들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홀로 된 노인이 연애라도 할라치면 노망들었다고 우스워하고 혹시라도 좀 더 깊은 관계로 번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게도 된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노인들일수록 자식들의 등쌀에 짓눌려 새로운 삶을 꿈꾸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서 정작 자식들은 노인을 돌보거나 가깝게 살기를 꺼린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제인 폰다가 열연한 영화 ‘밤에 우리 영혼은 (Our souls at night / 2017 라테쉬 바트라 감독)’은 노년의 노인들이 느끼는 결핍과 그 결핍에서 헤어나기 위한 노력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빼어난 작품이다.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 상대가 되어 달라” 오랜 이웃인 메디(제인폰다 분)의 난데없고 엉뚱한 질문에 루이스(로버트 레드포드 분)는 며칠 고심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의 상대가 되기로 한다. 두 사람 모두 짝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 매일 적적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들은 밤마다 만나 자신들의 내면에 갈무리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이상하게 본다.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도 결국 그 눈길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은 두 사람은 초연하게 자신들의 삶에 충실한다. 가족들 역시 낯설어하고 어려워한다. 특히 루이스의 과거를 잘 아는 메디의 아들은 자신의 엄마가 루이스를 사귀는 것에 못마땅해한다. 영화에는 메디의 손자를 정성껏 돌보면서 메디의 신임과 손자의 신임을 동시에 얻은 장면이 나온다. 부자지간에 볼 수 없는 애틋한 정이나 살가움이 조손(祖孫)간에 진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루이스는 메디의 손자와 자연스럽게 교감을 이룬다.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루이스가 손자를 잘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노인이 사회의 여러 면에서 충분히 대접받을 만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메디의 아들을 떠나, 이런 상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다. 특히 사회가 성숙하지 못할수록 여성에 대한 압박히 훨씬 심하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은 병이나 사고로 요절하지 않는 이상 모두 노인이 된다.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메디와 루이스의 만남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곧 닥칠 내일의 일이 될 수 있다. 영화는 노인들의 감정도 완전히 젊은이와 같을 뿐 아니라 제약이 따르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더욱 간절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메디와 루이스는 노년에 찾아든 사랑을 다시 꽃 피울 수 있을까?
박근영 기자 2023/11/23 00:00 -
 경주시립극단, 입체낭독극 ‘굿 닥터’ 공연
경주시립극단, 입체낭독극 ‘굿 닥터’ 공연경주시립극단 제2기 시민연극교실이 2023년 발표작 ‘굿 닥터’를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선보인다. 올해로 2기째인 시민연극교실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특별 프로젝트다. <사진> 이번 공연은 고전 코미디 명작으로 손꼽히는 닐 사이먼의 ‘굿닥터’가 선정됐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삶과 행복의 의미를 잔잔한 감동과 유머로 구성한 옴니버스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무료다. 예매는 경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립예술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길 경주시립극단 예술 감독은 “누군가의 마음에 떨림을 준다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며 “이번 시민연극교실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삶이 풍요롭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선아 기자 2023/11/23 00:00 -
 산내면 동편경로당, ‘노란 은행잎과 떠나는 초겨울여행’
산내면 동편경로당, ‘노란 은행잎과 떠나는 초겨울여행’새벽부터 해름까지 분주했던 발길 뜸한 들녘과 길가는 울긋불긋 노란 빛으로 물들었다. 황금빛을 자랑하던 들판은 소들의 마시멜로우가 뒹굴고 길가는 주황빛, 붉은빛 낙엽들이 흩날린다. 작은 바람에도 은행 알이 툭툭 바닥을 적시고 누구나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다. 산내 동편 경로당 행복선생님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가을 특별프로그램의 풍경이다. 프로그램은 손유희, 미술, 공예, 문예창작활동 등으로 진행했으며 그날그날의 낙엽재료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라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분주하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행복선생님들은 낙엽, 요리 문학, 그림, 노래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계절에 맞춰 마을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들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어르신들과 함께 낙엽을 활용한 인지프로그램은 뇌자극활동으로 치매예방에 좋다.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으며 흥미를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다는 장점도 지녔다. 산내분회 동편경로당 어르신들은 “평소에 보는 낙엽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다니 행복선생님이 참 고맙다”며 “올해는 노오란 은행잎 길을 볼 수 없어 아쉽게만 여겼는데 행복선생님이 경로당 오는 길에 은행잎을 가져와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은행잎을 펼쳐놓을 때는 또 뭘 시키려고 앉으라 하는지 궁금하기만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할 뻔 했다. “선생님의 잔잔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하루종일 있어도 심심치 않을 것 같다”며 선생님의 등을 토닥거렸다. 이선희 행복선생님은 “은행잎으로 어린 시절 눈싸움하듯 던져보기도 하고 함박웃음에 소녀시절로 돌아가 많이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지혜도 듣고 계절이 계절인지라 김장이야기도 들으니 이번 겨울은 더욱 맛있을 것 같다”고 어르신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윤태희 시민 기자 2023/11/23 00:00 -
 막바지 가을 풍경
막바지 가을 풍경막바지 가을 풍경 올해 이상기온으로 단풍잎이 제 색깔을 내지 못한 가운데, 통일전 가는 길 경북천년숲정원의 메타세콰이어가 막바지 가을 풍경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최진욱 시민전문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진욱 전문 기자 2023/11/23 00:00 -
 경주 동궁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경주 동궁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경주 동궁원이 지난 16일부터 병역명문가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른 이뤄진 후속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국내에서 3대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동궁원(식물원) 입장 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군경 또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입장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다. 단 버드파크는 무료입장에서 제외된다. 동궁원 관계자는 “입장료 감면혜택을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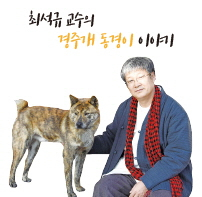 개와 관련된 속담은 생활의 지혜와 경험의 바탕
개와 관련된 속담은 생활의 지혜와 경험의 바탕속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요소이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속담은 주로 구어체로 사용되며, 속담은 각 문화와 언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된다. 속담은 명언과 유사하나 널리 유행하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속담 중에는 현대에 들어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어 사전 속에서나 남아 있는 것들도 대단히 많다. 속담은 경험과 지혜, 자연과 동물, 역사와 전설, 문화와 가치관을 풍자, 비판, 교훈 등으로 표현한 짧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수나 갈등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속담은 주로 구어체로 불확실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 또,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고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자연과 동물의 모습과 행동에서 받은 영감은 속담화 되어 많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개는 인간과 가까운 동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속담에 자주 등장한다. 개의 생활모습,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에 의해 생성된 특정 문화나 가치관이 반영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풍자, 비판, 교훈 등의 의미로 전해 내려온 속담은 다음과 같다. 교훈적 의미의 속담으로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개처럼 미천하게 벌어서라도 쓸 때만은 떳떳이, 복되게 쓴다는 말인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무슨 일이나 먼저 서두르고 나서면 도리어 남보다 뒤지는 수가 있다는 ‘꼬리 먼저 친 개가 밥은 나중 먹는다’.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등이 있다. 풍자적 의미의 속담으로 애탄 사람의 똥은 매우 쓰다는 데에서, 선생 노릇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어디에나 텃세는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개도 텃세한다’. 멋모르고 겁 없이 덤빔을 비유하여 이르는 의미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을 짐짓 싫다고 거절할 때 이를 비꼬는 의미로 ‘개가 똥을 마다할까’.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외톨이로 지내다는 의미로 ‘개 밥에 도토리’. 바닷가에 사는 개는 호랑이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닷가 개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천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다는,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가 그 예이다. 또 비판적 의미의 속담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를 비꼬는 말로 ‘너하고 말하느니 개하고 말하겠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뜻으로 ‘뒷간에 앉아서 개 부르듯 한다’.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겉으로 점잖은 체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은 먼저 한다. 자기에게 소용이 없으면서도 남에게는 주기 싫은 인색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인 ‘나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부부는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으로 ‘내외간 싸움은 개싸움’. 어떠한 물건을 지극히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 물건으로만 보인다는 뜻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등 사람과 가까이 지낸 개의 생활 모습에서 후회하지 않는 후일을 기약한 조상의 지혜가 개와 관련된 속담에 녹아있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마애탑·사면불·약사여래입상… 금강산의 대표 유적들
마애탑·사면불·약사여래입상… 금강산의 대표 유적들금강산엔 이차돈과 관련되진 않았지만 눈여겨볼만한 유적이 다수 있다. 백률사와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제121호), 100년 전까지 백률사 대웅전에 있었던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 백률사 대웅전 맞은편 바위벽에 새겨진 마애탑 등이 대표적이다. 백률사엔 약사여래입상 신묘한 이야기가 백률사는 ‘이차돈순교비’가 있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 신라 불교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사찰이다.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와 함께 경주 지역에서 신라 이후 지금까지 법맥을 이어온 4대 사찰로 꼽힌다. 백률사는 금강산 정상 남서쪽으로 해발 125m 지점에 있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신라 제31대 신문왕(재위 681~692) 대 이전 창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률사의 옛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대웅전과 요사채만 남은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백률사는 고려 말 왜구들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 무신 윤승순(尹承順, ?~1392)이 계림부윤으로 있을 때 당시 주지였던 견해(見海)와 함께 1377부터 1378년까지 2년에 걸쳐 수리했다. 지금 남아 있는 대웅전은 조선 선조 대에 수리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백률사 마당엔 옛 건물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과 석등의 옥개석 등이 남아 있다. 백률사 대웅전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국보 제28호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이 있었다. 국보 제26호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27호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 불국사의 두 불상은 좌상인데 반해 백률사 불상은 높이 1.77m 크기의 등신대 입상이다. 1930년 문화재 보호를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국립경주박물관 전신)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백률사 관음상의 영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다. 신라 제32대 효소왕(孝昭王, 재위 692~702) 원년의 일이다. 692년 효소왕이 부례랑을 국선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다음 해 3월 부례랑이 말갈족에게 잡혀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존고에 넣어둔 나라의 보물 만파식적과 거문고가 없어졌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왕이 1년 세금을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부례랑의 부모는 아들 걱정에 백률사 관음상 앞에서 여러 날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부례랑이 불상 뒤에 와있었다. 만파식적과 가야금은 향을 피우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부례랑은 탈출과정에서 스님의 도움을 받아 만파식적을 타고 바다를 건넜는데, 와 보니 백률사였다는 이야기다. 대웅전 맞은편 바위벽에 새겨진 마애탑도 눈길을 끈다. 대웅전 앞에 탑을 건립할 자리가 협소해 이곳에 마애탑을 새겼다고 전해진다. 이 마애탑은 전체 높이 3.15m, 기단부(받침돌) 폭 1m40㎝의 삼층탑으로, 얕은 부조 형식으로 제작됐다.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바위에 새겨진 9층탑과 7층탑은 목탑 형식을 딴 마애탑인 반면, 이 탑은 석탑 형식을 띠고 있다. 3개의 옥개석(지붕돌) 아랫면에 층급받침(역계단 모양)이 있고, 불국사 다보탑과 같은 화려한 모양의 상륜부(탑 꼭대기층)를 갖춘 형태다. 탑의 비례와 지붕돌 층급 받침이 3단인 점, 하층기단이 생략된 점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 하대의 일반형 석탑을 모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마애탑의 연대는 통일신라 하대 또는 고려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측 설명이다. 땅 팠더니 사면불 나왔다…굴불사지 경덕왕(재위 742~65년)이 백률사로 행차하던 도중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다. 왕이 그곳을 파게 하였더니 큰 돌이 나왔는데 그 돌 사면에는 사방불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에 절을 세우고 굴불사(掘佛寺)라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잘못 전해져 굴석사(掘石寺)라 한다.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에 대한 ‘삼국유사’ 기록이다.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이차돈 순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백률사로 가는 길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금강산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지금은 절은 사라지고 높이 3m 규모의 커다란 바위 사면에 조각한 여러 불상만 남아 있다. 총 9점의 불상·보살상이 환조와 부조, 선각 등 다양한 조각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이곳에 대한 첫 현황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은 1981년 5월 국립경주박물관 불적조사 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어 1985년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해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이곳 절터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소형 금동여래입상과 청동 동종, 청동 반자, 와편 등 4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 중엔 12세기쯤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굴석사’(東京屈石寺)란 명문이 새겨진 쇠북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굴불사가 ‘굴석사’란 이름으로도 불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의 유구로 짐작되는 남향을 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지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 또는 중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기와 유물 중에는 불상 편과 조로2년(680)명 안압지 출토 쌍록보상화문과 같은 전돌(사찰 등의 벽이나 바닥을 장식하는 데 쓰던 벽돌)이 다수 나왔는데, 발굴조사단은 이 유물 등을 근거로 8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굴불사 불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사면불 불상 양식은 대체적으로 8세기 중반의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불상 제작 방식도 확인됐다. 발굴조사 이전엔 현장에 있던 자연암반을 그대로 활용하여 불상을 새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 결과 바위를 인위적으로 이곳으로 옮겨온 뒤 조각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사면불 서면에는 서방 극락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아미타삼존불상이 새겨져 있다. 또, 동면에는 약사여래상이, 남면에는 여래와 보살상 2구가, 북면엔 11면 6비 관음보살상과 미륵보살로 추정되는 2구의 보살상이 각각 새겨져 있다. 굴불사지의 사면석불은 조성 당시엔 ‘사방불’로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 보이나 실제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방불’ 개념보다는 ‘사면불’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측 설명이다.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경덕왕이 이곳 땅을 파게 했더니 사방불이 나왔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사면불 주변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서면의 석불 머리 부분만 드러낸 채 나머지는 흙과 돌로 덮인 적이 있다. 1914년에도 비슷한 상태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덕왕 행차 이전 언젠가도 큰 비가 내려 사면불이 흙더미에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면불이 세워진 위치를 보면 더욱 수긍이 간다. 김운 역사여행가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3-1102]](http://www.gjnews.com/data/newsThumb/1700722634_thumb_3000.png)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3-1102]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3-1102]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3-1102 11월 7일 경주시 명계2길 104-31 부근에서 발견 처진 눈매, 낯가림이 아주 조금있어요. 믹스견 / 남아 / 1차 접종완료 중성화x / 50일 / 2.3kg 입양문의 054)760-2883 ※반려동물이 실시간 입양됐을 수 있으니 확인 전화바랍니다.
경주신문 기자 2023/11/23 00:00 -
 취약계층 독거노인 위한 후원금 전달
취약계층 독거노인 위한 후원금 전달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는 지난 10일 안강읍, 강동면, 현곡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금을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사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는 공기업으로서 ESG경영철학을 실현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직원들의 소중한 정성들을 모아 후원금 147만원을 기탁했다. 기탁한 후원금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병춘 경주지사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욱 기자 2023/11/23 00:00 -
 경주 거주 고려인 어르신 대상 가을단풍체험
경주 거주 고려인 어르신 대상 가을단풍체험고려인주민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하이웃이주민센터가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고려인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가을단풍체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번 체험은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에서 주관하는 ‘고려인 주민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하이웃이주민센터가 경북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버아카데미 참여 고려인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고려인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려인 2세들로, 고려인 3세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주로 온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이웃이주민센터는 지난 7일 이들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해 가을 주왕산 국립공원의 단풍과 공원 내 명소인 주산지를 찾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 지역 특산물인 청송사과와 닭백숙을 시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문화를 감상하면서 위로 받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한 고려인 어르신은 “단풍이 참 예쁘고, 한국에서 단풍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 이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조훈 하이웃이주민센터장은 “경주지역에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온 고려인 어르신들도 많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웃이주민센터는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고려인주민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아카데미, 스포츠교실을 통한 건강관리, 요리수업,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윤태희 시민 기자 2023/11/23 00:00 -
 운동회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신뢰 강화
운동회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신뢰 강화경주지역 내 초·중·고·대학생 자녀가 있는 32가정 100여명이 참여한 가족운동회가 지난 18일 화랑마을 화백관에서 열렸다. 경주시가족센터는 이날 가족돌봄영역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 참가자들은 센터가 준비한 판 뒤집기, 낙하산 달리기, 단체 줄넘기 등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경기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함께 경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운동회에 참가한 현곡면 주민은 “가족 모두가 몸을 부대끼며 신나는 운동회를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고, 미디어 없는 주말 오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해원 경주시가족센터장은 “참가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 가득한 얼굴을 대하니 그 즐거움이 전달되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경주시가족센터는 모든 유형의 가족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동회를 개최한 경주시가족센터는 지난해 경주시다문화가족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센터는 가족 기능강화를 위해 부모·부부·1인 가구·임신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가족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윤태희 시민 기자 2023/11/23 00:00 -
 처용무 배경 어디냐보다 누가 더 아끼느냐가 중요
처용무 배경 어디냐보다 누가 더 아끼느냐가 중요지난 17일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처용무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 경주시가 향후 개발할 10대 브랜드 중 하나인 처용무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 행사를 세부적으로 다룬 경주 언론매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매체들은 행사 주최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듯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천편일률의 기사들만 보도했다. 그러나 울산은 이날 행사를 매우 중대하게 본 듯하다. 지난 20일 이동우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울산매일 신문이 1면 전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한 처용무포럼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행사 당일 김성혜 교수가 발표한 ‘처용무의 역사도시 울산인가 경주인가?’에서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를 인용해 처용설화의 공간적 배경이 경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기사로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처용에 관한 한 실제 처용무의 배경이 어느 곳인지를 떠나 처용에 대한 심정적 온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경주에서 처용은 많은 소재 중 하나일 뿐이고 ‘기껏해야’ 경주시에서 목표하듯 10대 브랜드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울산에서 처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으로 보는 느낌이다. 실제로 이와는 별도로 울산은 오래전부터 처용무와 관련한 축제를 여는 등 처용무를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용이 어디를 주무대로 활동했느냐, 개운포가 어디냐는 식의 논란은 따지고 보면 부수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처용무를 아끼고 가꾸느냐이다. 경주의 행사에 참석해 경주의 언론매체들이 외면하거나 소홀히 다룬 처용무 포럼을 대서특필해 따지고 든 울산이 종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주가 할 말이 없어진 모습이다.
박근영 기자 2023/11/23 00:00 -
 우리나라 근대사의 보고 남양주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보고 남양주를 아시나요?남양주는 양주 남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지금은 양주의 행정구역이 좁아져 있지만 서울이 광역화되기 전까지 지금의 남양주, 구리시 등이 전부 양주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남양주는 조선시대 한양 도성과 가깝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접점을 이루며 경치가 빼어나고 물산이 풍부해 귀족 사대부들이 즐겨 살았던 곳이다. 대표적으로 한음 이덕형을 필두로 척화파 중심 김상헌, 숙종대 노론의 거두였던 김창협 창흡 형제, 실학자 정약용과 홍대용,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선구자 박규수, 서유견문의 서유구 등이 살았다. 이밖에도 경치가 좋다 보니 고관대작들의 별서(別墅)가 남양주 절경과 어울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세가 좋아 조선의 왕릉들이 조성된 곳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세조의 광릉과 광해군묘가 있다. 이웃한 구리에 동구릉(東九陵)이 있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원래 양주 땅이었다. 특히 구한말 격동기의 중심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모셔진 흥원, 고종의 홍릉과 순종의 유릉, 의친왕과 덕혜옹주의 묘, 기타 황실 사람들의 묘들이 몰려 있다. 대원군이 살았을 때의 위세와 달리 무덤은 초라하고 가꾸어지지 않아 사람들의 내왕이 뜸하다. 반면 고종의 홍릉과 순종의 유릉은 이전 조선왕들의 능과 달리 황제로서의 품격으로 치장되어 그 모습이 대조적이다. 남양주는 벽초 홍명희의 걸작 ‘임꺽정’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달라진 양주에 임꺽정의 생가터가 있다고 스토리텔링 되어 있지만 임꺽정이나 천왕동이가 한나절만에 양주에서 사대문 안을 예사로 들락거린 것을 고려하면 남양주가 합당해 보인다. 이밖에도 원효대사가 창건한 묘적사. 세조 때 세운 봉선사와 수종사, 다산마을과 실학박물관 등 주말이나 편한 시간에 남양주를 다녀보면 뜻밖의 의미 깊은 곳을 만날 수 있다.
박근영 기자 2023/11/23 00:00


